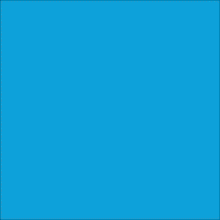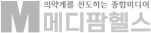매년 10월 20일은 국제골다공증재단이 제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World Osteoporosis Day)이다. 골다공증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인의 뼈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이 모두 감소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전신 질환이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척추 골절은 키가 줄거나 허리가 굽는 원인이 되고, 고관절 골절은 수술과 장기간 입원이 필요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준다. 나아가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해 폐렴,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진다.
방청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가벼운 충격이나 단순한 기침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검진과 예방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105만4892명에서 2024년 132만6174명으로 늘었다. 2024년 기준 환자의 약 94%가 여성이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뼈를 보호하던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골절 합병증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는 노화, 가족력, 폐경,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칼슘·비타민 D 결핍 등이 있다. 진단은 골밀도 검사가 기본이다.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는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한다. 특히 폐경 여성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 검진이 권장된다.
치료는 약물치료가 중심이다. 뼈 흡수를 억제하거나 뼈 생성을 촉진하는 약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낮춘다.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골절 여부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경구제, 주사제, 장기지속형 제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어 환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치료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야 효과가 유지되고, 중단하면 골밀도가 다시 감소할 수 있다.
방청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만큼 환자의 순응도가 치료 효과와 직결된다”며 “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약제와 투여 방식을 선택하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적이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뼈 건강의 기본이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같은 유제품과 멸치, 뱅어포 등 뼈째 먹는 생선에 풍부하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 부족해지기 쉬워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칼슘 800~1000mg, 비타민 D 800IU 이상이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체중 부하 운동과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근력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골절 위험을 낮춘다. 갑작스럽게 무리하면 부상 위험이 있어 개인의 체력과 관절 상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골절 경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낙상 예방을 위해 집안 환경을 정비하고, 시력과 청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방청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평소 생활습관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