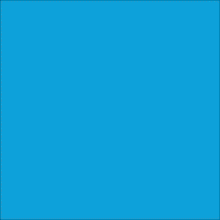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는 형벌의 연장이 되어도 되는가. 이미 법이 정한 처벌을 모두 치른 사람에게, 행정은 또 다른 처벌을 무기한으로 가할 권한이 있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면허 재교부를 논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신청이 기계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결과 재교부율은 과거 90% 수준에서 10% 안팎으로 급락했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온라인 회의라는 편의적 방식으로 한 사람의 직업과 삶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어떤가. “추천 위원이 소수라 결정권이 없다”, “회의 내용은 대외비라 설명할 수 없다”는 말로 한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회원의 생존권과 직업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침묵과 무기력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다. 의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면, 최소한 제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제도의 투명성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유에서,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교부를 거부한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와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며, 최소한의 정의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 죽음이 마지막이 되기 위해, 정부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억울함에 침묵을 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