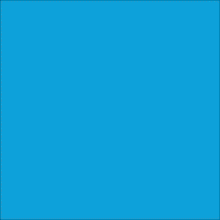경미한 뇌경색이나 이른바 ‘미니뇌졸중’ 환자에서 재발과 심근경색, 사망을 막기 위한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은 증상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며, 42시간을 넘기면 치료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료 시작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이건주 교수팀(이건주 교수·신재민 전공의.사진좌부터)은 국내 대규모 뇌졸중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미한 뇌경색 및 고위험 일과성 허혈발작(TIA) 환자에서 이중항혈소판제요법(Dual Antiplatelet Therapy, DAPT)의 효과가 증상 발생 후 약 42시간을 기점으로 소실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경미한 뇌경색이나 고위험 TIA 환자의 약 10%는 초기 재발이나 증상 악화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병용하는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을 24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권고돼 왔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병원 도착 지연 등으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임상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20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전향적 뇌졸중 코호트(CRCS-K-NIH)에 등록된 환자 중, NIH 뇌졸중 중증도 점수 5점 이하의 경미한 비심인성 뇌경색 또는 고위험 TIA 환자 4만1530명을 대상으로 치료 성과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이중항혈소판제요법군과 단일항혈소판요법군으로 나눴고, 치료 시작 시점을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24~72시간, 72시간 초과의 세 구간으로 구분해 90일 이내 뇌졸중 재발, 심근경색, 사망 등 혈관성 사건 발생률을 비교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성향점수 기반 가중치(IPTW)와 매칭 기법을 적용해 교란 변수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을 시작한 경우, 단일항혈소판요법 대비 혈관성 사건 위험이 약 26% 감소했다. 반면 24~72시간 사이에 시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72시간 이후에 시작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시간에 따른 치료 효과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의 유의미한 효과는 증상 발생 후 약 42시간 전후에서 소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을 넘어서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이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논문 제1저자인 신재민 전공의는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며, 약 42시간을 넘기면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처음으로 정량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이건주 교수는 “경미한 증상이라고 해서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되며, ‘될 수 있으면 빨리’ 병원에 도착해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치료가 지연되더라도 4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연구로, 향후 진료지침 보완과 임상 의사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Timing of Initiation and Efficacy of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Minor Stroke or High-Risk TIA’라는 제목으로 뇌졸중 분야 국제학술지 ‘Stroke’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