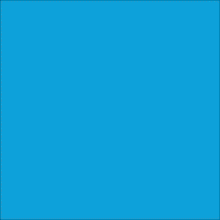소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체질량지수(BMI)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를 1년 이상 사용한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국내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키의 경우 치료군에서 평균 신장이 소폭 낮았으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송지훈 연구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82013년 사이 ADHD를 새롭게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3만 4,850명을 성인기(2025세)까지 최대 12년간 추적 관찰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아기(6~11세)에 ADHD를 진단받은 집단의 성인기 평균 BMI는 24.3㎏/㎡로, ADHD가 없는 대조군(23.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과체중·비만에 해당할 가능성도 ADHD 진단군에서 약 1.5배(AOR 1.51) 높게 나타났다.
특히 ADHD 진단 후 메틸페니데이트 치료를 받은 경우, 성인기에 과체중·비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대조군 대비 약 1.6배(AOR 1.60)로 더 높았으며,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 BMI가 가장 높게 관찰됐다.
키의 경우 ADHD 진단 여부만으로는 성인기 평균 신장 차이가 없었다. 다만 메틸페니데이트 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평균 신장이 소폭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에서 확인된 신장 차이도 1cm 미만으로 임상적 의미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저신장 위험은 치료군에서 약 1.08배로 소폭 증가했지만, 누적 처방 기간과 키 사이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송지훈 연구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ADHD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성장기 환자에서는 체중과 키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전국 단위 자료를 활용해 소아·청소년기 ADHD 치료 경험과 성인기 신체 지표의 연관성을 장기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문의 진료와 처방 없이 학업 성취를 목적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성장과 체형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게재됐다.